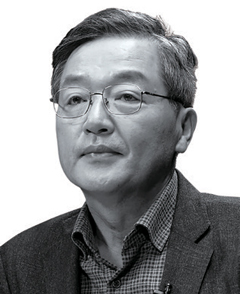중국 역사에서 ‘간신열전’이라 하여 처음으로 ‘간신’ 항목이 등장한 것은 《신당서(新唐書)》부터다. 그것은 아마도 성리학이 본격화된 송나라 때 다시 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 중국 역사서에는 ‘간신’ 항목 대신 영행(佞幸)이나 폐행(嬖幸)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참고로 같은 기전체로 된 《고려사》에는 ‘간신열전’과 ‘폐행열전’이 모두 들어있다. 간신이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나라와 임금에게 해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면 영행이나 폐행은 사사로이 아첨해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얻어 지위와 부를 차지한 사람이다.
사마천이 열전에 ‘영행 열전’을 둔 것이 시초다. 사마천은 그 열전을 이렇게 시작한다.
“세속에 이런 말이 있다.
‘힘써 농사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정성껏 섬기는 것이 임금의 뜻에 맞추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다. 여자만이 미색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벼슬살이하는 관리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한나라 문제(文帝)는 조선의 세종을 연상시킬 만큼 훌륭한 임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특이하게도 아무런 재능도 없는 등통(鄧通)이라는 인물을 한없이 아껴주었다. 이를 《논어》에서는 혹(惑)이라고 하는데 암군도 아닌 명군인 문제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지 알아보자.
등통은 그저 노로 배를 잘 저어 황두랑(黃頭郞)이라는 말직에 있었다. 문제가 하루는 꿈에서 하늘에 오르려다가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 한 황두랑이 뒤에서 밀어주어 하늘에 올라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황두랑의 옷에 등 뒤로 띠를 맨 곳의 솔기가 터져 있었다. 잠에서 깬 뒤 점대(漸臺)로 가서 꿈속에서처럼 밀어준 황두랑을 은밀히 찾다가 등통을 보니 그의 옷의 등 뒤가 터진 것이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를 불러 성과 이름을 물었더니 성은 등(鄧)이고 이름은 통(通)이었는데 문제는 아주 기뻐했고 총애하니 하루하루가 달랐다. 통(通) 역시 삼가며 신중한 데다 밖에 나가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휴가를 주어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문제는 거만(巨萬) 전을 내린 것이 10여 차례였고 벼슬은 상대부(上大夫)에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종종 통의 집에 가서 놀았는데 통에게는 별다른 재능은 없었고 인재를 추천할 줄도 몰랐으며 오로지 자기 한 몸 근신하며 상의 비위를 맞출 뿐이었다.
다시 열전의 한 대목.
문제가 일찍이 종기를 앓은 적이 있는데 통은 늘 상을 위해 그 고름을 빨아냈다. 문제는 마음이 편치 않아 조용히 등통에게 물었다.
“천하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통이 말했다.
“마땅히 태자를 따를 사람이 없지요.”
태자가 문병을 오자 문제는 태자에게 종기를 빨라고 시켰다. 태자는 종기를 빨기는 했으나 낯빛을 보니 난처해했다. 얼마 후에 (태자는) 등통이 늘 황제를 위해 고름을 빨아낸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했지만 이 때문에 통을 원망했다.
등통의 이 행동이 바로 장자(莊子)가 말한 연옹지치(吮癰舐痔)의 연옹, 입으로 종기의 고름을 빤다는 것이다. 지치란 치질 앓는 항문을 핥는다는 뜻이다.
역사에서 이 같은 폐행이나 아첨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노골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아랫자리에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는 있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각료 인사청문회를 보니 폐행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폐행이 중용되어서 성공한 경우는 없다. 실패한 경우는 너무 많은데 진시황이 중용했던 조고도 간신이자 폐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